난리난 폐업하는 김밥집들 ㄷㄷ.jpg

- 09-18
- 3,794 회
- 0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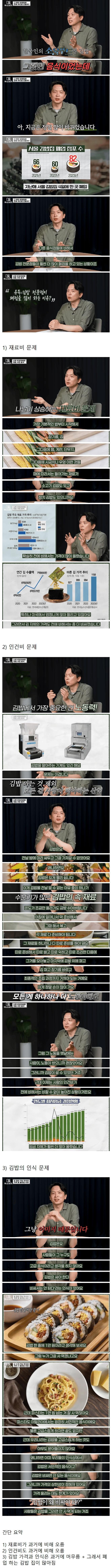
최근 서울에서 김밥집이 많이 문을 닫는 모습은 통상적인 업계 흐름에 머무르지 않는다. 서민의 대표 한 끼로 여겨지던 김밥이 왜 이렇게 빠르게 생존선을 잃고 있는지, 현장의 구조적 요인을 차분히 짚어보려 한다.
가장 큰 배경은 재료비의 급등이다. 쌀, 김, 참기름 같은 기본 재료는 물론 햄, 달걀, 단무지, 시금치, 우엉까지, 김밥 한 줄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 원가가 높아지면 마진 축소로 이어지거나 가격 인상 여력이 제한되면서, 소형 자영업자의 손실 흡수 능력이 약해진다.
재료비의 상승은 고기나 해산물이 포함된 메뉴의 부담을 더 키운다. 소고기 김밥이나 참치 김밥처럼 재료비가 큰 품목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같은 판매가로는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폐점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늘어날 여지가 커진다.
또 다른 축은 시장 구조의 변화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체인은 대량 구매와 공급망 관리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배달 플랫폼의 확산까지 더해지면, 소규모 점포는 배송 수수료나 노출의 불리함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소비자 행동도 변하고 있다. 한 끼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경향은 여전하지만, 가성비와 메뉴 다양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소형점의 차별화가 쉽지 않다. 배달 중심의 주문 증가도 매출 구성에 변화를 주고 있다.
전개되는 현상을 해석하는 창은 여러 갈래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일 수 있고,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의 상승이 겹친 결과일 수도 있다. 공급망의 불안정이나 물류 비용의 급증도 한 몫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현상은 단순한 업태의 쇠퇴가 아니라, 구조적 재편의 신호로 읽을 여지가 있다. 정책의 방향성이나 업계의 대응에 따라 회복 속도와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생산-유통-소비의 연결고리를 다시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