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못돌아가는 미국인.jpg

- 09-25
- 3,033 회
- 0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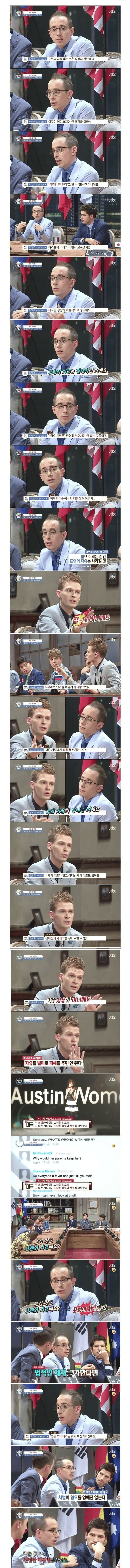
일리야의 말에 한 표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혐오 표현까지도 보호되는가를 두고 양 극단이 맞서는 형태로 흘러간다. 비정상 회담 같은 매체 맥락에서 제기된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다”는 주장은 이론적 절대성의 맛을 남기지만, 현실은 법적 예외와 사회적 규범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미국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하지만 판례와 법적 한계가 존재하고, 어떤 발언이 실제로 처벌되거나 플랫폼에서 차단될 수 있는지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결국 자유의 범위는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 규칙과 적용의 문제로 살아 움직인다.
케이크를 자르는 비유로 보면, “표현의 자유의 한 조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가 핵심 쟁점이다. 혐오 표현을 그 조각으로 남겨둘 수 있는가, 아니면 특정 발언군을 전면적으로 잘라내야 하는가가 법적, 도덕적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플랫폼과 법의 역할 차이가 또 한 축이다. 미국 법은 공적 권력이 표현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지만, 민간 플랫폼이나 기업은 자체 규정을 통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른바 자유의 절대성은 국가 권력의 구속에 더해, 사적 영역의 규범 형성으로도 작동한다.
혜소 표현의 사회적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혐오 발언은 특정 집단의 안전을 침해하고 굳어지는 편견을 강화할 위험이 있어, 배제와 차별을 강화하는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 반면, 과도한 검열은 공개적 논의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냉소를 키울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범이 미국과 다르게 작동하는 맥락도 주목할 만하다. 각국의 법체계와 사회적 합의가 다르기에, 같은 문제라도 제재의 강도나 담론의 허용선은 다르게 나타난다. 국제적 비교는 자유의 의미를 재점검하게 만든다.
미디어는 이 논쟁의 프레이밍을 결정한다. 자극적 사례를 과도하게 부각하면 공론의 흐름이 왜곡될 수 있고, 맥락의 부재는 이해의 갭을 키운다. 따라서 시청자 입장에서도 법적 원칙과 실제 사례 사이의 간극을 구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답은 하나로 제시되기 어렵다. 더 강한 플랫폼 규제일지, 법적 테두리의 재구성일지, 아니면 교육과 공적 담론의 질을 높이는 방향일지 다양한 가능성이 남아 있다. 각 방향은 자유의 가치와 사회적 안전 사이의 균형을 다르게 설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