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살 경찰 수험생

- 09-18
- 4,316 회
- 0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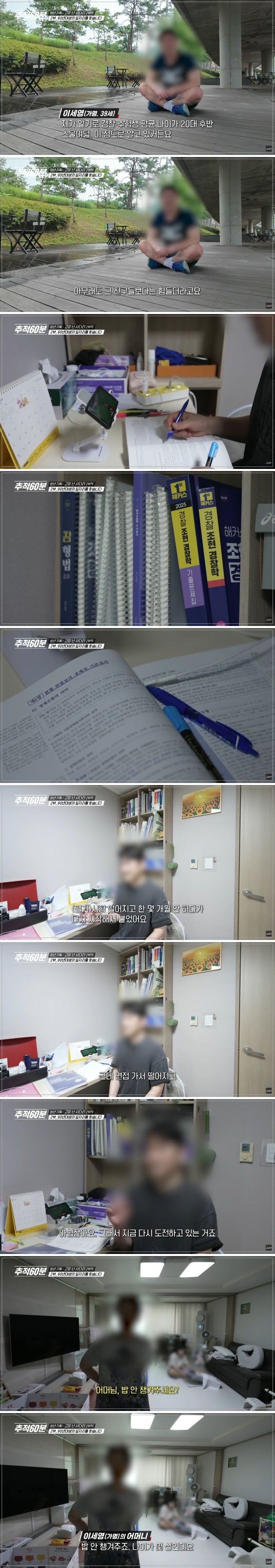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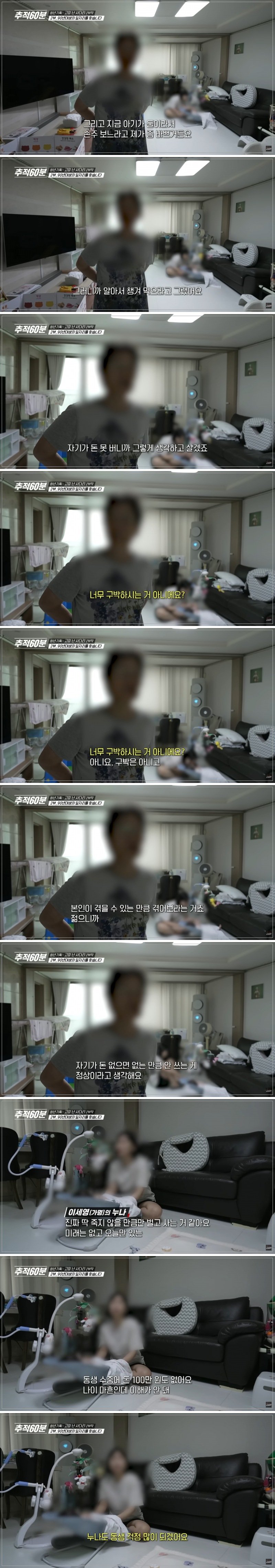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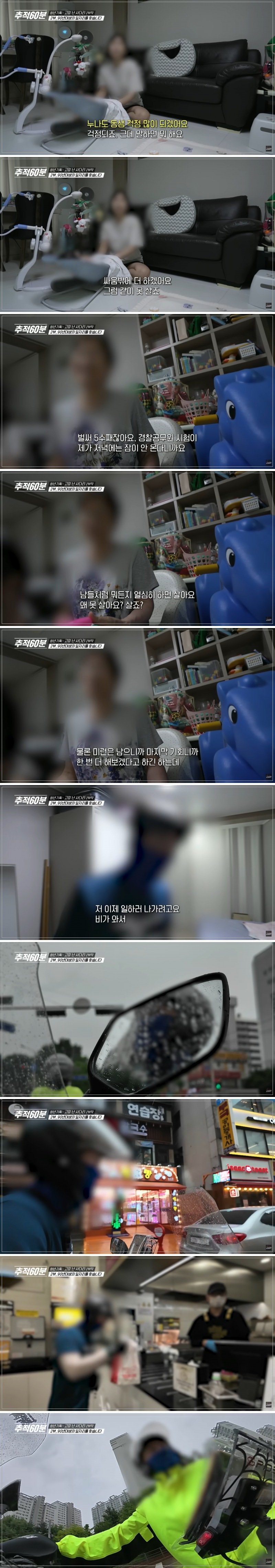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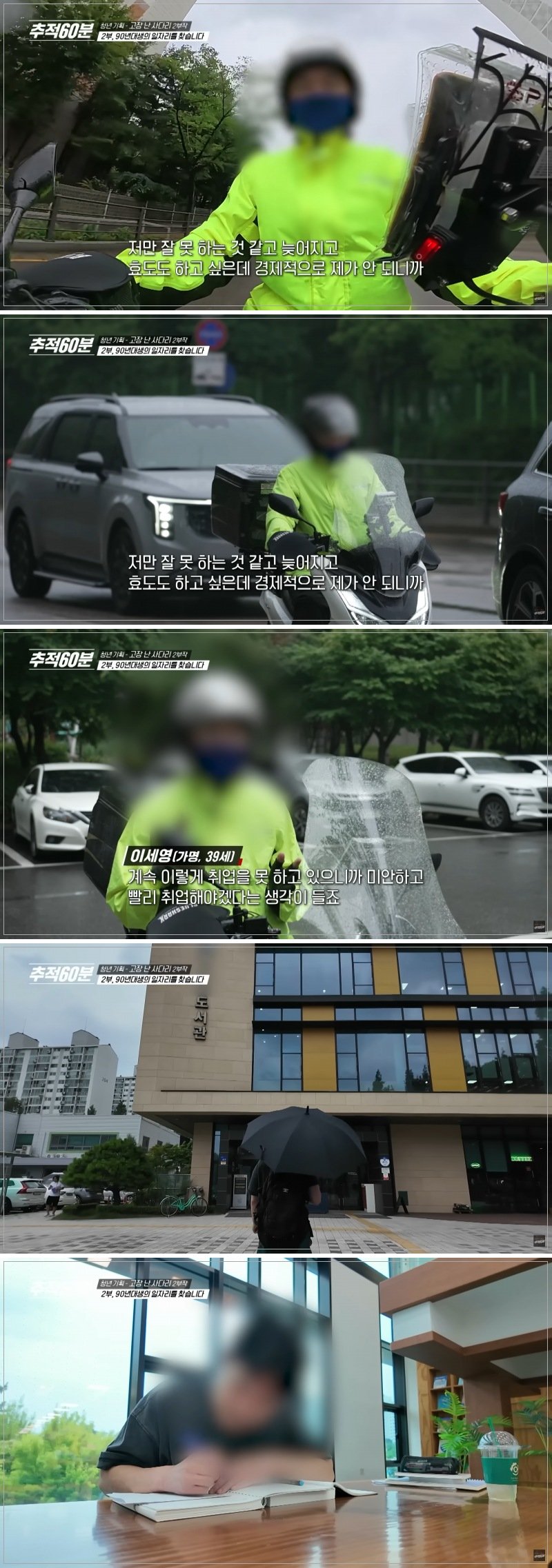
.
최근 방송과 기사에서 39세의 경찰 수험생 이야기가 주목을 받는다. 경찰 채용의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잡히지만, 이 사례는 나이의 벽이 여전히 큰 현실임을 보여준다.
‘고장난 사다리’라는 표현은 청년 세대의 커리어 경로가 제자리에서 멈추는 구조를 지적한다. 정규 고용의 축이 약해지고, 공무원으로의 진입도 치열한 경쟁과 긴 대기 속에서 더 버티게 된다.
90년대생의 일자리를 찾습니다와 추적60분의 보도는, 연령 기반의 취업난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문제는 예산과 제도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용시장과 교육 시스템의 괴리가 경찰학 같은 전문 영역의 시험과 공직 채용에서 드러난다. 이른바 전문성의 축을 중시하는 채용 구조가, 실무 기회와 연계되지 않으면 ‘경력의 문’을 지나치게 좁힐 수 있다.
현행 헌법상의 경제적 기본질서는 시장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되, 공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돼 있다. 성장과 안정 사이의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효과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 사건들을 두고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제도적 설계의 문제가 커리어의 ‘사다리’를 깨뜨렸는지, 둘째, 공공부문 채용의 연령제한이 시대 흐름과 불일치하는지, 셋째, 청년의 자기개발과 재교육 기회가 충분한지.
정책은 다층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중장년 재교육과 평생학습 체계 강화, 공공-민간의 직무 연계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